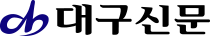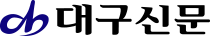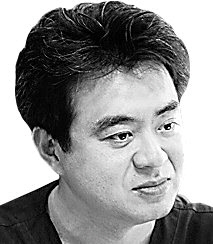
의학은 정답이 있는 과학이지만 의료는 정답이 없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의사가 되기 위한 의과대학 공부는 그야말로 365일 시험에 정답을 찾아 헤매는 과정이다. 응급실에 연약해 보이는 인턴 여선생님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들은 첫 사체 실습에서 울음을 터트리며 도망갔지만 시험 전날엔 한 손엔 노트를 들고 사체를 만져가며 정답을 찾아 공부했던 시신의 두려움정도는 가볍게 씹어 먹어 버렸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졸업 후에 만나는 진료 환경(심평원 변수, 환자의 사회 경제적 변수 등)은 낯설다. 의사 면허를 따고 나서 진료현장에서는 과거의 정답이 오답이 되어 버린다. 해마다 바뀌는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학회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도 벅찬 데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고시는 나날이 새로 변경된다. 교과서 적인 진료가 언제 오답이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다 언제 삭감이 될지도 모르고 의료사고가 나면 구속될 지도 모르는 불안감까지…….
의사들은 어릴 때부터 칭찬과 격려에 익숙한 엄친아가 대부분이라서 사회의 의사직군에 대한 비난과 질책에 더 민감하게 좌절한다. 의사들의 직업의식과 사명감은 사회적 신뢰와 기대를 먹고 자란다. 소수 몇몇 의사들의 일탈한 행동들을 대서특필하여 선한 다수 의사들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의사들이 이제는 맷집까지 생겨버렸다. 여론을 의식하지 않기 시작했고 정책에 무관심했던 의사들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상대가치점수제가 어떤 제도인지도 알고 건정심(건강보험정책 심의 위원회)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의사들의 변화가 이번 의사협회장 선거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40대의 젊은 나이에 의사협회장으로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은 정부의 의사 때리기와 이간질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할 적임자이다. 향후 정부가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를 깨뜨리는 정책을 계속 펴 나간다면 의사들의 분노는 소극적으로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분만실 등 힘든 과 기피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좀 더 적극적으로는 휴진이나 파업 같은 투쟁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의사와 환자와의 바람직한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의사는 환자와의 관계에서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임을 국민에게 알려야하고 적용해야 한다. 환자는 의사에게 최선의 결과를 바라지만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그 결과에 대한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사들에게 변호사들의 사례와 같은 성공보수는 없다. 하지만 치료에 실패했다고 해서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 또한 없어야 할 것이다. 의사들도 이제는 의료정책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하고 진료실에서는 심평원의 삭감을 이겨내고(?)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기만적인 정부의 의료정책을 질타 할 수 있어야 하고, 고령사회와 의학의 발전에 따른 의료비 상승에 대해서도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 정부는 솔직하게 현재의 잘못된 구조(저수가-저부담)를 인정하고 실비보험회사만 살찌우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버리고 진정한 필수의료(국가 책임 의료)를 우선순위에 두고 보장성 확대를 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