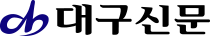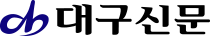신뢰자본이란 말이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페나 탁자위에 노트북, 휴대폰을 놔두고 화장실에 가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천달러를 테이블위에 놓고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열차를 탈 때 검표를 하지 않는다. KTX 승무원이 무선단말기를 들고 표 팔린 자리만 확인한다. 과거에는 모든 자리를 검표했고 승객들은 검표를 위해 미리 가서 줄서고, 철도청은 표를 인쇄하고 날짜마다 표 색깔도 다르게하니 비용이 많이 들었다. 모든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고 의심하는 데 쓰는 비용이 엄청났다. 모든 사람을 신뢰해서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 신뢰자본이다. 그대신 무임승차로 잡히면 10배~30배 요금을 내야 하는 징벌적 배상제가 있다.
한국의 신뢰자본은 서울역에서 멈추고 더 이상의 제도나 운영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사회에서 신뢰도가 10% 올라가면 경제성장율이 0.8%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었다. 2020년 우리나라의 GDP가 1천 898조였는데 이 금액의 0.8%면 GDP 1조 5천억원이 늘어난다는 말이다.
신뢰자본이 작동하지 않는 예를 보자. 정부는 RND 투자에 매년 20조 정도를 투입한다. 투자를 받은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야 할텐데 그 시간에 영수증을 정산하고 진도를 보고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기관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나 영수증을 보며 따져보는데, 기관마다 포맷도 다 다르다고 한다. 정부 투자를 몇 번 받으면 연구에 전문가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정산 리포트 작성에 도사가 돼 있다는 말이 나온다. 게다가 이런 연구의 과제 성공률 거의 100%다. 민간에 연구과제를 맡기는 이유는 리스크가 큰 어려운 연구이기 때문인데 이런 어려운 연구가 매번 100%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또 이런 연구결과가 실제 특허로 상용화 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매우 낮다.
선진국은 꼼꼼하게 대상자를 추려서 우수 과학자에게 그냥 준다. 생활비로도 쓰면 되고 3년에서 5년 뒤 연구성과를 보고 결과가 좋으면 또 준다. 영수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본다. 과학적 발명은 천개나 만개 중에 한 개만 성공하면 나라전체가 먹고 살게되므로 신뢰자본을 쓰는 것이다.
형편없는 결과를 내면 다음에 연구비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연구비 남용이 드러나면 30배의 배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왜 신뢰자본이 잘 돌아가지 않을까. 2011~2013년 경제사범 재판통계를 보자. 1천 300여건의 범행 가운데 액수 300억원 이상 범죄를 저지른 11명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총수나 경영자 등 최고위층은 70% 이상이 집행유예였다. 집행유예는 참작사유를 판결문에 적게 돼 있는데 박태웅 의장의 조사결과 참작사유를 제대로 적은 것은 5%에 불과했다. 박의장은 “300억이 넘었으니 집행유예 준다. 고위직이니 집행유예 준다고 쓸 수 없어 못 적은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독일 형법조항에는 ‘법질서를 방위해라. 국민들의 법에 대한 믿음을 거슬러서 는 안된다’라고, ‘이를 거슬러 집행유예를 하면 안된다’고 돼있다. ‘경제범죄, 탈세, 화이트칼라, 공권력 범죄는 되도록 집행유예하지말고 실형선고하라’고 돼 있다. 우리는 정반대다. 신뢰자본을 제대로 쓰면 사람들이 편하고 경제도 성장해 빨리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데 기득권 앞에서는 막혀 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