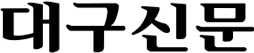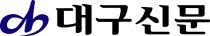LP는 대부분 살아남았고, 책·악보·CD는 솎아내기를 거쳤다. 그리고 카세트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는 거의 다 버렸다. 버림받은 것들의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정말 귀했던 것들이 이제는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언제나 보고 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레슨을 포함한 나의 연주 녹음들, 이제 다시 들을 날이 오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 아무튼 이런 기준으로 눈물을 머금고 나의 청춘의 흔적들을 버렸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과유불급이라, 주체하기 어려운 것들은 결국 손길한번 주지 못한 채 세월만 가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버리자! 해서 한 결단이었다.(이 모든 자료를 작은 USB에 담는 방법도 있었지만 거기에 드는 에너지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물론 가끔씩 뼈저린 후회가 밀려들기도 하지만 속 시원한 마음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녀석들인데, 정말 줄이고 줄여서 방 한 칸을 차지하는 정도만 남은 음반과 책에 날이 갈수록 부채감이 쌓여 간다는 것이다.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오면서 오랜 로망이었던 제대로 된 책장을 장만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크기를 고려해 주문 제작한 책장에 이모든 것들을 보기 좋게 꽂아 넣을 수 있었다. 그런데 CD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책장 아래 칸 서랍에 눕혀서 두다보니 손이 잘 가지 않는다. 게다가 손쉽게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 경우가 잦다보니 더 그렇다. 특히 나처럼 전공을 한 사람들은 일종의 모니터용으로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이엔드 오디오에 대한 욕망이 크지 않다. 그러니 CD를 끄집어 낼 일이 자꾸만 줄어든다.
LP음반은 상대적으로 애정이 크다.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은 LP가 가진 그 촉촉한 음색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학전집처럼 한꺼번에 산 것이 아니라 한 장씩 모으는 가운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 당시의 추억까지 담겨있어 더 소중하다. 고르고 고른 음반을 품에 안다시피 들고 와선 밤을 새워 들으며 받은 감동과 깨달음의 순간이 음반 하나하나에 아로새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중고 시장에 내어놓는다면 고가에 거래되리라 짐작되는 것들도 많다. 다만 이것 역시 먼지를 닦고 판을 뒤집어야 하는 불편 등의 이유로 주로 관상용(바라만 봐도 좋긴 하지만)의 신세다.
그리고 책장의 주인공(?) 책은 스스로 자라나 싶을 정도로 자꾸 늘어난다. 가지런히 꽂혀 있는 것 위에 가로로 책을 얹어놓는 것을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점차로 그렇게 된다. 해서 책은 지금도 수시로 솎아내고 있음에도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 책을 읽는 속도보다 사들이는 게 더 빨라서 그렇다. 절판되어 구할 수 없던 책을 우연히 중고서점에서 발견해 사놓고도, 손에 들어오기 전의 그 보고 싶던 열정은 어디로 갔는지 고이 모셔만 놓고 해가 바뀌도록 읽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면 되는데 그 낮은 턱을 넘지 못하고 책 사는 것에 더 열심인 것은 지적 허영심? 아니면 게으른 자의 전형적 행태? 아무튼 읽은 책 중에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 외에는 어지간하면 들어낸다. 그래서 지금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읽지 않은 게 훨씬 많다. 이제 더 이상 신간에는 관심 끄고 집에 있는 책만 읽어도 한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마음의 양식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아마 남아있는 이것들도 언젠가는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들을 것들은 한번 씩 들으며 그 속에 아롱져있는 추억도 소환해보고, 또한 오랫동안 벼르고 있는 저 책도 죽 일독을 하고 나면 처분도 홀가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음반을 끄집어낸 후 정성스럽게 닦아 턴테이블에 올려서 듣는 음악은 더 각별하다.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책 읽는 시간은 참 행복하다. 이것이 나의 밀린 숙제이니, 숙제치고는 참 부담 없고 즐거운 것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