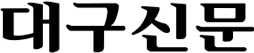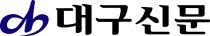TV를 시청하다 보면, 정치 시사 토크나 교양 다큐멘터리, 심지어 오락 프로그램에서 ‘지식인이나 전문가’로 초대된 인사들이 대화 중간 중간 영어 단어를 자연스럽게 끼워 넣어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된다. “그건 어떤 intention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이건 약간의 consensus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identity의 문제라고 생각해요.”라는 식이다.
주로 학벌이 높거나, 해외 유학파이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해당되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따금 당황스럽다. 그들이 말하는 단어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헬스’, ‘미팅’, ‘컨펌’ 등의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paradigm’, ‘narrative’, ‘validity’ 같은 말들이 대화 중에 아무렇지 않게 섞이고, 영어 단어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 결국 그 의미는 시청자가 전체 대화의 맥락 속에서 유추해야 한다. 이럴 경우 토크가 아닌 ‘자막없는 외국어 수업’이 된다.
그런데 반전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방송인들의 태도에서 일어난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종종 TV 예능 프로그램이나 토크쇼 출연한 외국인 방송인들의 언어 사용 방식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음이 다소 서툴더라도, 단어 선택이 제한적이더라도, 가능한 한 자기 생각을 순수한 한국어로만 풀어내려고 노력한다. 그들에겐 영어가 과시의 언어가 아니었고, 한국어로 의미를 전달하는데 부족함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일부 지식인들만의 문제일까라고 반문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대구의 공공문화기관들의 외래어 사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공공문화기관들이 자체 기획하는 프로그램의 제목이나 행사의 주제를 영어로 짓는 것은 다반사가 됐다. 심지어 국문 표기 없이 영어로만 표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다. 아동이나 노년층,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 등 제시된 영어로 명명된 행사명은 이름만으로도 거리감이 생긴다. 어떤 공연인지, 무엇을 다루는지조차 제목만 보고는 알 수 없다면, 그 기획은 성공이라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일부 계층과의 소통을 차단하는 격이 된다. 이는 곧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목표로 하는 공공문화기관의 방향성에서 벗어난다. 행정은 언어를 통해 시민에게 다가가야 하며, 공연장은 지역 문화를 지키고 확산시키는 언어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즈음에서 “왜 우리사회는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옅어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은 한국어를 지키려 하고, 한국인은 굳이 영어를 섞어 말하려 하는 걸까? 과시일까? 아니면 습관일까? 그도 저도 아니면 사대주의일까? 한국의 언어혼용 현상은 단순히 “외래어 남용”이나 “글로벌 시대니까”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의 개입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영어 단어의 혼용을 지적 우위로 받아들이는 현상이다. 일상어 대신 ‘옵션(option)’, ‘컨센서스(consensus)’ 등의 영어 단어를 쓰는 순간, 지식 자체보다 지식의 외피가 기능하며 화자는 자신의 위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말과 외래어의 혼용은 단순치가 않다. ‘정체성’을 ‘identity’라고 습관적으로 발화하는 순간, 이 단어가 한국어에서 지닌 역사적, 정서적 함의는 희석되고, 우리의 고유성 또한 위협받게 된다.
국제화 시대에 영어가 유창한 것은 분명 큰 경쟁력이다. 외국인 관광객, 국제 예술교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영어 병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일상 속 대중과의 소통에서 오히려 소통력을 저해하면서까지 무비판적으로 영어 일변도로 흐르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국제적인 역량을 높인다기보다, ‘국제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국어와 영어를 병기해야 한다면, 한국어로 먼저 명명하되, 그 뜻을 살린 공식 영어 번역을 함께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섞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것’이다.
황인옥 문화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