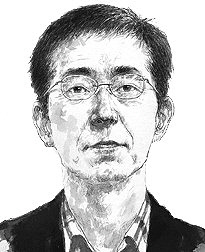굵은 빗방울 후두둑 떨어지면
천지를 빗소리로 가득 채워
물동이·땅바닥 ·농작물 잎 등
각기 다른 장소에 떨어지며
화음처럼 조화롭게 들려와

기상 이변과 그로 인한 피해 관련 뉴스가 어느 때보다 지구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후위기가 기상학자들만의 관심사에 그치는 일이 아님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극한 폭염이 이어지더니 이달(7월) 중순에는 극한 폭우가 덮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며칠간의 장마 폭우가 끝나자마자 다시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봄에는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고 그 피해도 막심하지 않았는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어떻게 펼쳐질지 참으로 걱정이다.
다행히 필자의 집 주변은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가 별로 없었다. 지난해 7월 초순 내린 호우로 산비탈이 무너져 내려 밭 옆을 흐르는 개울의 둑이 무너지고 물길이 바뀌는 등의 피해를 입은 곳이 복구·정비가 되지 않아 항상 걱정이었다, 비가 올 때면 걱정이 돼 이곳 상태를 확인하곤 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 덕분에 이번 장마철에는 별 걱정 없이 빗소리를 실컷 들을 수 있었다. 홀로 시골집에서 지낸 덕분에 빗소리 정취에 흠뻑 빠져들 수 있었다.
빗소리는 아무래도 비가 자주 내리는 여름철에 많이 듣게 된다. 소나기 소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교향곡 못지않은 멋진 음악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빗줄기가 점점 세차지면서 천지를 빗소리로 가득 채우며 절정에 이른다. 그리고 어느 순간 빗줄기가 잦아드는 듯하다 다시 세차지고 더한 절정으로 치닫기도 한다. 소나기가 그치기 시작하면서 빗줄기가 잦아들 때 들리는 빗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도 촉촉이 젖어들게 하게 한다. 이때는 물동이에 떨어지는 빗소리, 땅바닥에 떨어지는 빗소리, 농작물 잎에 떨어지는 빗소리,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 등이 각기 다른 소리와 느낌으로 조화롭게 들려온다. 멀리서, 가까이서 들려오는 빗소리의 화음 또한 각별하다.
어린 시절, 감자나 옥수수를 삶아먹고 다양한 부침개나 장떡을 부쳐 먹으며 시원하게 내리는 빗소리를 듣던 장면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청우(聽雨)’를 주제로 한 옛 시
이런 빗소리에 대한 느낌이나 감상은 사람마다 처한 환경과 나이 등에 따라 다를 것이다. 빗소리나 비 오는 풍경은 멋진 문학 작품을 낳기도 한다.
중국 송나라 시인 장첩(蔣捷)은 ‘빗소리를 듣다(聽雨)’라는 시(宋詞)를 남겼다.
‘젊어서는 가루(歌樓) 위에서 빗소리를 들었는데(少年聽雨歌樓上)/ 붉은 등불에 비단 휘장이 어스름했네(紅燭昏羅帳)/ 장년에는 나그네 실은 배 위에서 빗소리를 들었다네(壯年聽雨客舟中)/ 강은 넓고 구름은 낮은데(江闊雲低)/ 무리 잃은 기러기는 가을바람에 우짖어대네(斷雁叫西風)/ 지금은 절집 아래서 빗소리를 듣는다만(而今聽雨僧廬下)/ 귀밑머리털은 어느새 희끗희끗/ 슬픔과 기쁨, 만나고 헤어짐 모두 무덤덤하고(悲歡離合總無情)/ 그저 섬돌 앞 점점이 물 떨어지는 소리 새벽이 되기를 기다릴 뿐이네(一任階前點滴到天明)’
빗소리를 듣는 감흥을 기준으로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눠 이야기하고 있다.
장첩보다 조금 앞선 시기(남송)의 작가 신기질(辛棄疾·1140-1207)이 남긴 ‘채상자(采桑子)’라는 작품(宋詞)도 인생의 단계를 잘 묘사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작품은 ‘청우(聽雨)’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청우’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소년 시절에는 시름이 뭔지 모르고(少年不識愁滋味) 높은 누각에 오르는 것을 좋아했네(愛上層樓)/ 높은 누각 오르기를 즐기면서(愛上層樓) 새로운 시를 짓기 위해 억지로 시름 있는 듯이 하였네(爲賦新詞强說愁)/ 지금은 시름의 맛을 다 알기에(而今識盡愁滋味) 말하려다 오히려 그만두네(欲說還休)/ 말하려다 오히려 그만두고(欲說還休) 그저 날씨가 선선하니 좋은 가을이구나라고 말할 뿐이네(却道天凉好個秋)’
작가 자신의 인생 경험과 감회를 압축적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시름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소년 시절에는 진정한 시름이나 비애를 알지 못했다. 감수성은 예민했지만, 삶의 무게를 겪어보지 못했기에 시름을 개념적으로만 이해했다. 그래서 높은 누각에 올라 비를 듣거나 주변 풍경을 보면서, 마치 어른인 양 새로운 시를 짓기 위해 억지로 시름을 지어내 표현했다.
지금은 시름의 맛을 잘 안다. 신기질 자신도 북벌을 주장하다 좌절하고 좌천되는 등 굴곡진 삶을 살았다. 진정한 슬픔을 알게 된 지금은 그 슬픔을 말하려다가 오히려 그만두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마지막 구절을 통해, 슬픔을 잘 알지만 굳이 말하지 않고 담담하게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인생에 대한 달관과 초월의 경지를 엿볼 수 있다. 빗소리도 그저 자연의 한 소리로 받아들일 뿐이며, 슬픔이나 감상에 얽매이지 않는 경지를 읽을 수 있다.
조선 후기의 뛰어난 여류 운초(雲楚) 김부용(金芙蓉)에게도 빗소리가 각별했던 모양이다. 황진이, 이매창과 함께 조선 시대 3대 기녀 시인으로 꼽히기도 하는 그녀는 빗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들렸던 모양이다.
그녀의 시 ‘부용당에서 빗소리를 들으며(芙蓉堂聽雨)’이다.
‘옥구슬 일천 섬을(明珠一千斛)/ 유리쟁반에 쏟아 붓는구나(遞量硫璃盤)/ 알알이 동글동글(箇箇團圓樣)/ 물나라 신선이 빚은 환약이구나(水仙九轉丹)’
청각적 느낌을 시각적이고 매우 아름다운 이미지로 승화시키고 있다. 빗방울 하나하나의 영롱함과 청량함이 느껴지는 표현이다. 비가 단순한 비가 아니라, 어떤 영험하고 정화하는 힘을 가진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평안남도 성천 출신으로 뛰어난 문학과 가무 실력을 겸비했던 그녀는 함경감사 김이양(1755~1845)의 소실이 된 후 시와 거문고로 여생을 보냈다. 시집 ‘운초당시고(雲楚堂詩稿)’가 전한다. 김이양의 소실이 되고 나서 15년 후인 1845년, 김이양이 별세하자 김부용은 그를 애도하는 시에서 ‘15년 함께 지내오다 오늘 돌아가시니, 백아가 이미 끊은 거문고 내어 다시 끊노라’라고 읊었다.
갈등 끊이지 않는 중동지역
빗소리를 충분히 못 듣는 것이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
이곳에 적당히 비가 내린다면
갈등 해소에 도움 되지 않을까
얼마 전 한 지인이 나의 시골집을 방문해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집 마당에 파초를 심어보라고 권했다. 자신의 집에 파초가 있는데 특히 여름에 비올 때 파초 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며, 생각이 있다면 파초를 한 뿌리 주겠다는 것이었다. 하긴, 옛 사람들도 이국적인 식물인 파초를 무척 사랑했다. 파초를 마당에 심어놓고 넓고 시원스레 생긴 잎을 감상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파초 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감상하는 걸 즐겼던 것이다.
내년 봄에는 파초를 집 마당에 심고 잘 가꾸어서 파초 잎이 들려주는 빗소리를 즐겨볼 생각이다. 파초에 떨어지는 각별한 빗소리의 정취를 누릴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서거정(1420~1488)은 ‘즉사(卽事)’라는 시에서 ‘아이 불러 대통 이어 물 끌어오게 하는 것은(呼兒爲引連筒去)/ 파초 얻어 길러서 빗소리를 듣기 위함이라네(養得芭蕉聽雨聲)’라고 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