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대홍수에 산사태 발생
경북 4개 지역 사망자 200여명
군위 부계면 남부 일대 마을은
삽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때 마을 덮쳤던 바위와 돌들
주민들이 쌓아 돌담으로 변모
2006년 문화재 등록 예고했지만
주민들 거부에 끝내 등록 못해

군위군 부계면에는 1년에 서너 차례 다녀온다. 문중 납골묘가 있기 때문이다. 부계면에는 동산리와 남산리, 대율리(한밤마을), 가호리 등 8개 마을이 있다. 문중 납골묘는 동산리와 남산리 산에 있다. 동산리 납골묘는 바로 옆으로 작은 하천(계곡)이 흐른다. 큰 하천을 아니지만, 팔공산 높은 곳에서 시작된 하천이라 물이 마르지 않고, 비가 많이 오면 홍수 피해를 입곤 하는 곳이다.
2023년 여름에도 많은 비가 내려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당국에서 곧 피해복구를 했다. 그런데 납골묘 아래 쪽(과수원 지역)은 대대적으로 복구공사를 마쳤지만, 납골묘 옆은 산이라서 관할 당국도 다르고 해서인지 복구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 지난달 중순 비로 인한 피해도 더해졌다. 하천에 돌들이 더 많아지고 흐르는 물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 계곡을 보면 크고 작은 바위나 돌로 가득한 것을 알 수 있다. 큰 비가 오면 이런 바위들이 떠내려 오고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땅 속에는 크고 작은 바위들이 가득 묻혀있고, 홍수가 나면 그런 바위들이 함께 떠내려가면서 피해를 입히는 지역이다.
동산리와 남산리 아래에 있는 대율리(한밤마을)의 돌담(6.5㎞ 정도)이 유명하데, 2006년 대율리 돌담을 취재해 보도할 때 당시 마을 어른은 900여 년 전 이곳에 홍 씨가 터를 잡으면서부터 돌이 많은 땅이라 돌을 이용해 담을 쌓기 시작했다고 했다. 최근 이 마을의 돌담 대부분이 1930년 큰 홍수 때 떠내려 온 돌들을 활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난달 중순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혔다. 산청군은 군민 전체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곳곳에 산사태와 침수 등으로 마을이 사라져버리는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 이달 초에는 무안에 20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기도 했다. 홍수 피해를 실감했는데, 1930년에는 군위군 부계에 이보다 더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모양이다.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 마을 전체를 쓸어버리는 참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소위 ‘경오년 대홍수’다.
◇경오년 대홍수와 돌담
2006년 문화재청은 ‘고성 학동마을 옛 담장’을 비롯해 전국의 10곳 옛 돌담길의 문화재 등록을 예고하는 문화재청 공고(2006년 4월 18일)를 냈으나, 이 가운데 ‘군위 부계 한밤마을 옛 담장’은 주민들이 거부해 끝내 문화재 등록이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비록 문화재 목록 등재는 무산되었으나, 당시 문화재청이 등록예고 사유로 함께 제시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들어있었다.
‘마을의 담장은 대부분 돌담으로 경오년(1930) 대홍수로 떠내려 온 돌들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고 전해진다. 축조방법은 막돌허튼층쌓기로 하부가 넓고 상부가 다소 좁은 형태로, 넓은 곳은 1m 이상인 경우도 있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서 채집된 강돌로 자연스럽게 축조된 돌담은 전통가옥들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고, 곡선형의 매우 예스러운 골목길의 정취를 자아내고 있으며, 보존 또한 잘 되어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고즈넉한 풍경과 정취를 더하고 있는 이 마을의 옛 돌담은 1930년의 참혹했던 대홍수가 남긴 결과물인 것이다. 이 마을 입구 도로 가에 당시의 수해 참상을 고스란히 기록한 ‘수해기념비(水害記念碑)’가 자리하고 있어, 그 홍수 피해가 어땠는지 확인할 수 있다.
‘소화 5년(1930년) 7월 13일(경오년 음력 6월 18일) 저녁나절, 큰 뇌우에 팔공산이 무너지고 홍수가 일어나 군내 부계면의 남부 일대에 피해가 가장 혹심하였다. 거친 물결이 밀려들어 동쪽 끝 마을 하나를 먼저 쓸고 곧장 대율리 위쪽 초입에서 막히자 그 요충지를 부수면서 동서로 나뉘어 들이쳤다. 93호가 유실되고 사상자가 92인이었다. 갈 곳을 잃고 슬피 부르짖는 자가 360여 인이며, 살림살이와 논밭 등의 손실은 계산하기 어려웠다. 이 소식을 듣고 곧 산 넘고 물 건너 밤을 새워 조문을 하였다. 그곳에는 떠내려 온 시신들이 서로 엉켜 있고 까마귀와 솔개가 날고 있었다. 부엌은 부서져 밥 짓는 연기는 찾을 수 없고 개구리울음이 들릴 뿐이었다. 상전벽해의 변화가 마침내 이곳에 닥치게 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위로했으나 얼굴이 모두 시체 빛이었다. 이에 서로 방략을 강구하여 경상북도와 조선총독부에 보고를 올린 것이 궁성에까지 들어가게 되자, 시종을 파견하였고 많은 관리들이 운집하였다. 위로는 내탕금을 내렸고, 아래로는 공사간의 지원으로 그 혼을 달래고 그 유골을 묻어주었다. 굶주리는 이에게는 음식을 내리고, 집을 잃은 이에게는 하늘을 가릴 곳을 마련해 주었다.
오호라, 우홍(禹洪; 우임금의 홍수)이 아무리 컸다고 하나 어찌 이 같은 참화에 이르렀을 것인가. 또한 한나라 조칙(漢詔)이 아무리 너그러웠다 하나 어찌 이처럼 넉넉할 줄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마침내 모두가 말하기를 ‘이 재난은 하늘이 실로 내린 것이지만 우리를 진흙더미에서 끝내 건져냄으로써 되살려준 것은 어찌 상하원근의 사람들이 베풀어준 은덕이 아니겠는가. 원하노니 우리 군수의 문장을 빌려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사양치 못하고 전말을 간략히 서술함과 아울러 위문해준 여러 분들의 명단을 굴러온 큰 돌에 기록하는 것으로써 기념을 삼고자 한다.’
1931년(소화 6년) 5월 10일, 비문(碑文)은 당시의 군위군수인 황영수(黃英秀)가 짓고, 글씨는 대구 사람 서병주(徐炳柱)가 쓴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수해기념비(水害記念)’란 제목 글씨는 당시 경상북도지사 하야시 시게키(林茂樹)가 휘호한 것이다.
1930년 7월 13일 당시, 대만(臺灣) 부근에서 발생하여 북상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과 한반도 주변으로 기압골의 형성이 맞물리면서 중부 조선의 곳곳은 최악의 자연재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와중에 팔공산의 북쪽 사면을 끼고 있는 군위군 부계면 남부 일대(동산리, 남산리, 대율리 등)에 보기 드문 집중호우가 내린 탓에 무지막지한 물 폭탄과 산사태로 이들 마을은 그야말로 삽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 당시의 참상에 대해서는 ‘매일신보’ 1930년 7월 18일자에 수록된 ‘산홍(山洪)이 창일(漲溢)하여 팔공산(八公山) 아연 붕괴(俄然 崩壞), 재변시간(災變時間)은 불과 입분(不過 卄分), 희(噫)! 이백여 명(二百餘名)이 참사(慘死)’라는 제목의 기사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번 경북(慶北)의 산홍수피해(山洪水被害)는 전율(戰慄)을 느끼게 한다. 달성(達城), 군위(軍威), 칠곡(漆谷), 영천(永川) 4군(郡)의 피해(被害)는 상상 이상(想像 以上)이다. 아직 정확(正確)한 수(數)는 판명(判明)치 안 하나 대개(大槪) 사자(死者) 200명(名) 이상(以上)일 것이다. 가옥(家屋)의 도궤(倒潰) 이백여 호(二百餘戶), 부상자(負傷者) 10명(名)인 것 같다. 그 외(外)에 전답(田畓)의 유실(流失) 수백 정보(數百町步), 산붕(山崩) 37개소(個所), 교량(橋梁)의 유실(流失) 백여(百餘)나 될 것 같다. 실(實)로 경북 미증유(慶北 未曾有)의 수해(水害)이다. 근근(僅僅) 20분간(分間)에 비참사(悲慘事)가 일어난 것이다. 더욱 산비사(酸鼻事: 애통한 일)는 군위군 부계면 동산동(軍威郡 缶溪面 東山洞)이 전멸(全滅)하여 이전(以前)의 종적(踪跡)조차 없다는 것이다.’
엄청난 홍수로 대율리(한밤마을) 위쪽에 있는 동산리 마을이 흔적도 없이 떠내려가 버리면서 그 위로부터 떠내려 온 바위와 돌들이 한밤마을을 덮쳤던 것 같다. 그 수많은 바위와 돌들이 정리된 돌담으로 변모, 그 참사를 담고 있는 셈이다. 기후변화로 극한 폭우도 더욱 잦아질 것이라 한다. 홍수를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대비책이 절실함을 절감하게 하는 한밤마을 돌담이기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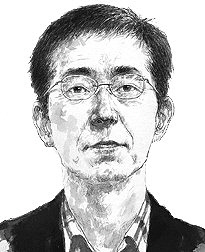
글·사진=김봉규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