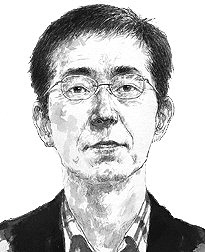◇어락도의 시초, 연파조도 장지화
唐 숙종 때 관직 올랐다가 은거
유유자적 엿보이는 아호 부여
魚의 樂·家, 어부까지 소재 삼아
소동파도 지화 작품 참조 글 써
요즘 곁에 두고 읽는 책 중 하나는 ‘동기창의 화선실수필’이다. 중국인 동기창(1555~1636)이 지은 ‘화선실수필(畵禪室隨筆)’을 번역한 책이다. 중국 서화 예술의 거장인 동기창(董其昌)의 서화 및 문예 평론서이다. 명나라 말기 최고의 문인이자 서화가이며 비평가인 그는 조선 후기 서화 예술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특히 문학·예술과 선(禪)을 결합한 새로운 비평의 안목을 제시하여, 창작과 비평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화선실수필’에는 동기창의 서화관을 중심으로 문예관과 선사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서예와 회화에 관한 이론과 평론, 시와 산문에 대한 평론, 선사상에 관한 단상 등이 실려 있다.
며칠 전 ‘어락도(漁樂圖)’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송나라 때의 명수(名手)인 거연, 이성, 범관 등 여러 공(公)들이 모두 어락도를 남겼다. 이는 연파조도(烟波釣徒) 장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안노공(安魯公:안진경)이 지화에게 시를 지어주자, 지화가 스스로 이를 그렸던 것이다. 이 당나라 때의 아름다운 일을 후인들이 계승하여 그리면서, 어은(漁隱)의 뜻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구절이 있었다.
연파조도 장지화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져 이리저리 자료를 찾아보았다. 장지화(張志和)는 당나라 사람으로 원래 이름은 구령(龜齡)이고, 호는 현진자(玄眞子)다. 16살 때 명경(明經)을 거쳐 천거되었다. 숙종(肅宗) 때 대조한림(待詔翰林)이 되었는데, 숙종은 그에게 ‘지화’란 이름을 하사했다고 한다. 나중에 어떤 일에 연루되어 밀려났다가 사면을 받아 돌아온 뒤에는 뜻을 접고 태호(太湖) 주변에 은거하면서 문학과 그림으로 일생을 보냈다. 숙종(재위기간 6년)이 짧은 생애를 마감하면서 장지화는 의지할 곳도 없어진 상황이었다.
이때 스스로 아호를 ‘연파조도(烟波釣徒)’라 지었다. ‘안개 이는 물결 위에 낚시하는 무리’라는 의미다. 시가를 잘 지었는데 자연 속에 사는 즐거움을 주로 노래했다. 서화에도 능했고, 피리도 잘 불었다. ‘어가자(漁歌子)’ 5수가 유명하며, 저서에 도가저작(道家著作) ‘현진자(玄眞子)’가 있다.
장지화의 삶이 어락도와 연결되는데, 특히 ‘어가자(漁家子)’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기도 하는 그의 시 ‘어가자(漁歌子)’가 드렇다. ‘어부가(漁父歌’)로도 불리는 어가자는 어부의 소박하고 유유자적하는 삶을 묘사한 것으로 장지화가 지은 사(詞)이다. 그가 남긴 어부의 노래 ‘어가자’ 그 첫째 수와 둘째 수를 보자.
‘서새산(西塞山) 앞에 백로가 날고/ 복사꽃 흐르는 물에 쏘가리가 살쪘도다/ 푸른 대나무 삿갓에 풀잎 도롱이 걸치니/ 비껴 부는 바람과 가는 비에도 돌아갈 필요 없다네’
‘낚시터 어부는 베옷으로 갓옷 삼아 입고/ 둘씩 셋씩 짝지어 작은 배에 타네/ 능히 배 저으며 물살 타는 법 익히니/ 장강의 흰 파도 걱정한 적 없다네.’
장지화가 태호(太湖)를 떠돌던 중 호주(湖州) 태수로 부임한 안진경을 알현하였다가, 연회에서 이 어부사 5수를 지었다고 한다. 제1수는 소동파가 ‘완계사(浣溪沙)-어부(漁父)’로 재구성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안진경은 서예 안진경체의 주인공인 인물이다. 태호를 떠돌던 774년 가을에 안진경이 호주 태수로 부임했다. 고서 ‘속선기(續仙記)’에 ‘안진경이 호주자사가 되어 문객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는 어부사(漁父詞)를 노래하였다. 그 첫 번째 노래가 장지화의 어부사 서색산전(顔眞卿爲湖州刺史, 與門客會飮, 乃唱和爲漁父詞. 其首唱卽志和之詞 西塞山前)’이라는 기록이 있다.
안진경은 장지화를 지극히 아껴, 한번은 장지화에게 낚싯배를 보내겠다고 하니, 장지화가 ‘혹시 낚싯배를 만들어주시려는 은혜는 제가 물을 집으로 삼아 떠돌기를 바란 것입니까. 강호를 거슬러 올라가고 초(苕)와 삽까지 왕래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최고로 여겼는데, 이 촌놈의 복입니다’라고 답하며 흔쾌히 그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 일은 당시 스님 교연(皎然)의 ‘안진경이 장지화에게 나룻배를 내린 일에 시로 화답하여’란 시에서 ‘나무를 깎아 새로 조그만 낚싯배를 만드네, 제후가 배를 하사한 것이 이로부터 시작되었구나’라고 한 것으로 보아 사실인 듯하다.
장지화의 ‘어부가’를 이용해 지은 소동파의 사(詞)는 다음과 같다.
‘서새산 산자락엔 백로가 날고/ 산화주 너머에 돛단배 한척 가물거리니/ 복사꽃 흐르는 물에는 쏘가리 살쪄있네/ 스스로 대나무 삿갓으로 몸을 가리고/ 비껴 부는 바람과 가랑비에도 돌아갈 필요 없다네’
◇‘어락’의 다양한 연원
장자의 추수 ‘호량의 대화’에서
물고기의 즐거움 주제로 이야기
박제가는 ‘호량의 대화’로 그림
물고기 입신양명·부귀영화 상징
◇장자의 지어지락(知魚之樂)
어락도는 장자의 ‘어락(魚樂)’ 이야기가 연원이기도 하다. 장자 이야기에서 비롯된 ‘어락도(魚樂圖)’는 장지화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어락도(漁樂圖)’와는 그 의미가 약간 다르다.
장자가 혜자와 함께 어느 강가의 다리(濠梁) 위에서 노닐고 있었다. 장자가 말했다. “피라미가 한가롭게 놀고 있군. 이것이 물고기의 즐거움이지.” 이에 혜자가 말했다. “그대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겠는가?” 장자가 말했다. “그대는 내가 아닌데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르는 줄 어떻게 아는가?” 혜자가 말했다. “나는 그대가 아니니 물론 그대를 알지 못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대는 물고기가 아니니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그러자 장자가 말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 그대는 ‘어찌 그대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단 말인가’라고 했지만, 이미 그것은 내가 안다는 것을 알고서 내게 물은 것이 아닌가. 나는 이 강 위에서 그것을 알았네.”
서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내용이다.
‘장자(莊子)’ 추수(秋水) 편에 나오는 이 ‘호량(濠梁)의 대화’는 물고기의 즐거움, 즉 ‘어락(魚樂)’을 주제로 한 많은 그림의 소재가 되었다.

실학자 초정(楚亭) 박제가(1750~1805)는 전문 화가가 아니었지만 ‘어락도’를 남겼다. 물고기 한 쌍이 새끼들을 거느리고 왼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왼쪽 빈 공간에는 또 다른 물고기 한 마리와 새우 한 마리가 그려져 있다. 물고기의 출현에 놀란 듯 도망가는 새우와 수초 사이에서 고개를 내미는 새끼 물고기의 모습이 그림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화제(畵題)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나에게 묻지만 나는 호상에서 알았네(知之而問我 我知之濠上也)’라고 적어 장자의 ‘호량의 대화’를 소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락도를 비롯한 물고기 그림은 입신양명과 부귀영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작품으로 많이 선호되었다. 그 중 쏘가리를 그린 궐어도는 문인화뿐만 아니라 민화에서도 특히 많이 그려졌는데, 쏘가리의 ‘궐’이 궁궐의 ‘궐(闕)’ 자와 발음이 같기 때문이다. 자식이 과거급제로 궁궐에서 근무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던 것이다.
하늘은 높고 물고기도 살찌는 계절이 다가왔다. 너와 나의 마음도 살이 찌는, 가을하늘처럼 맑아지는 계절이 되었으면 한다. 물고기도 즐겁고 만물이 즐겁기를 바라지만, 물고기의 즐거움 여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은 아닐 것이다. 물고기가 즐겁게 노니는 것으로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자신도 물고기처럼 인생을 즐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락(魚樂) 여부를 논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즐거운 자락(自樂)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가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