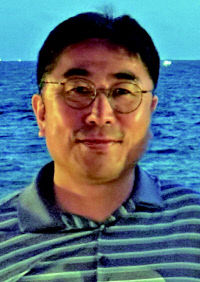
고향에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아침 선잠 결에 내 이마를 쓰다듬는 거친 손결을 느꼈습니다. 까칠한 나무껍질 몇 개가 내 이마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실눈을 뜨고 보니 아흔 살 가까운 할머니였습니다. 눈 어둡고 귀 멀어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서 내 이름도 잊어버리곤 하던 할머니가 내 이마를 쓰다듬으며 내 아들놈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증손자의 이름을 부르며 내 서늘한 핏줄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대추나무 한 그루가 내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내 몸의 구멍이란 구멍, 모든 구멍 속에서 뿌리가 나왔습니다. 우주의 검은 공간이 펼쳐지고 대추나무에 별들이 매달려 반짝였습니다. 내 몸의 365개 혈血 자리가 뜨끔거렸습니다. 대추나무, 대추나무…… 그해 가을, 커다란 태풍이 불어왔을 때도, 마당 한 구석에 우주를 매달고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수= 1998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2008년 바움작품상 수상. 포토포엠 시집 ‘봄, 꿈발전소’, 서사시집 ‘서사시 대백제’. 2014년 ‘오페라 운영’, 2017년 ‘오페라 이도 세종’, 2023년 ‘오페라 취화선’ 대본작가. 제6회 시산맥창작기금 수혜. 2025년 첫시집 ‘위대한 밥’ 발간.
<해설> 제목이자 중심 소재로 보이는 대추나무를 어떻게 시로 썼을까? 궁금해서 읽어 내려가다가 보니, 역시! 무릎을 탁! 치게 한다. 시인은 상관물로 대추나무를 데려와서 대추나무가 지닌 특징적인 요소인 오래 묵은 몸통의 쩍쩍 갈라지는 현상을, 아흔 살 할머니의 손등으로 환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 할머니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인데도 시인 아들 즉 증손자의 이름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내 서늘한 핏줄을 쓰다듬고 있다는 그것은 놀라운 직관인 듯 또한 “내 몸의 구멍이란 구멍, 모든 구멍 속에서 뿌리가 나왔습니다. 우주의 검은 공간이 펼쳐지고 대추나무에 별들이 매달려 반짝였습니다.”라는 문장에 이르러서는 체험적 상상력이 우주적 상상력으로 건너가고 있음에 몸에 생긴 핏줄과 대추나무의 잔가지들 모양새가 또한 다르지 않음을, 시인은 발견하면서 가시를 달고 있는 대추나무 그 뜨끔거림을, 마당(지면) 한 구석을 감동이란 붉은 별로 달구고 있다. -박윤배(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