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마살(驛馬殺)이 있다는 것 - 움직임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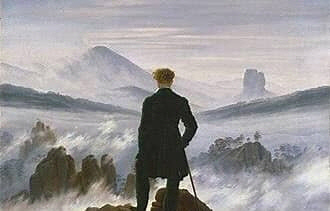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내 사주에 역마살이 있어서 한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늘 바쁜 거 같아요” 그러면서 피곤하다고 말한다.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거나, 자주 이사를 가거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많은 경우 ‘역마살이 있다’고 말한다. 역마살이 있으면 피곤한가? 분주한가? 정말 그럴까? 역마는 단순히 ‘분주함’이 아니다. 그 안에는 움직임의 이유가 있고, 나름의 방향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역마의 이치와 방향,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역마살(驛馬殺)은 12신살 중 하나로, 주로 역마라고 불린다. 역마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글자로, 12지지 글자에서 인사신해(寅巳申亥) 네 글자를 말한다. 역마의 에너지는 끊임없이 움직이려 하고, 새로운 시도에 마음이 설레며, 한곳에 머무르지 않으려는 성질이다. 급한 성격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일의 성향이나 직업의 형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역마의 성격을 드러난다.
사주팔자 속에서 이 글자가 들어 있으면 흔히 ‘움직이는 운명’이라고 해석하지만, 사실 역마는 움직이되 의미 없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길을 찾아가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
봄의 시작 인(寅)은 ‘삼양지처’
양과 음의 기운이 대적하고 있어
가을 시작 신(申)은 ‘삼음지처’
음-양이 같은 기운으로 마주 봐
◇자연은 언제나 움직인다
사주팔자에서 시간의 기준은 절기(節氣)다. 절기는 태양과 지구의 위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기온의 차이를 기준으로 삼으며, 만세력(萬歲曆)에 절기가 표시되어 있다. 절기의 명칭이 대체로 농사짓는 것과 관련된 문자와 표현이 많다는 것에서 농경을 중시했던 문화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간지(干支)는 자연 운동을 기호로 표현한 것이며, 간지는 기운 변화의 인자를 나타내는 수단이다. 이 간지가 절기에 의해 바뀌는 것이다. 즉, 절기를 중심으로 달(月)을 나누게 되는데, 절기는 태양과 지구의 각도나 위치를 표현한 것이므로 어느 한 절기를 지나면 기온의 변화가 찾아온다. 올해의 경우, 11월 7일 입동(立冬)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오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절기는 태양과 지구의 각도 변화로 생기는 계절의 숨결인 것이다.
자연은 언제나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건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해석할 수 없다. 차면 기울고, 기울면 차게 된다. 오행의 음양 운동은 지지에서 춘하추동의 4계절로 나뉘고, 이것을 다시 열두 달로 나뉘고, 각 달에 2개의 절기가 들어가 24절기가 된다. 지지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은 12지지의 음양 에너지 흐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동지(冬至)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길 때다. 동지에 이르면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데, 가장 어두운 곳에서 양의 기운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봄은 인묘진(寅卯辰), 여름은 사오미(巳午未), 가을은 신유술(申酉戌), 겨울은 해자축(亥子丑)이다. 인사신해는 봄·여름·가을·겨울, 즉 네 계절의 시작점이다. 즉, 인·사·신·해는 계절의 문을 여는 존재, 즉 새로운 시작선에 서 있는 자연의 역마인 셈이다.
자(子)는 동지(冬至)에서 양의 기운이 시작되므로 일양(一陽), 축(丑)은 이양(二陽), 인(寅)은 삼양(三陽), 진(辰)은 오양(五陽), 사(巳)는 육양(六陽)이 된다. 자(子)에서 시작된 양의 에너지가 사(巳)에서 여섯 개가 되고, 오(午)에서 하지(夏至)가 된다. 이러한 양의 기운이 강한 곳에서 음의 기운이 일어나게 된다. 오(午)는 일음(一陰), 미(未)는 이음(二陰), 신(申)은 삼음(三陰), 유(酉)는 사음(四陰), 술(戌)은 오음(五陰), 해(亥)는 육음(六陰)이 된다. 그다음 자(子)에서 다시 일양으로 시작되어 양 기운이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자(子)에서 사(巳)까지가 양(陽)운동, 오(午)에서 해(亥)까지가 음(陰)운동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음양 에너지의 변화를 통해 인신 역마 글자가 가진 에너지를 살펴보자.
봄의 시작인 인(寅)은 삼양지처(三陽之處)이다. 양의 기운이 셋이라면 음의 기운도 셋이라는 뜻이다. 가을의 시작인 신(申)은 삼음지처(三陰之處)이면서 동시에 양의 기운 또한 셋이다. 봄의 시작 인(寅)은 양과 음의 기운이 대적하고 있고, 가을의 시작 신(申) 또한 음과 양이 같은 기운으로 서로를 마주 보고 있다. 절기로 인(寅)은 입춘(立春), 신(申)은 입추(立秋)가 된다. 자(子)에서 양 기운이 시작되더라도 땅에서 봄이 되는 것은 인(寅)이 되어야 하고, 오(午)에서 음 기운이 시작되더라도 땅에서 가을이 되는 것은 신(申)이 되어야 한다
봄·가을의 기운 제대로 나타난 것
역마의 시작은 ‘단단하게 서 있음’
어디론가 ‘떠날 수 있는 힘’인 것
움직임 속에 중심·가는 방향 있어
◇‘입(立) 의미 - 확고하게 서서 시작한다
절기의 이름에는 ‘입춘(立春)’, ‘입하(立夏)’, ‘입추(立秋)’, ‘입동(立冬)’이 있다. 입(立)은 ‘설 입(立)’, 즉 ‘확고히 서다, 자리를 잡다, 존재하다,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서다’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쓸 수 있다면 입춘은 봄이 스스로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낸다는 뜻이 되고, 살아있는 모든 만물들이 봄의 기운과 더불어 땅위로 솟아나는 것을 ‘봄의 기운이 확고하게 제자리에 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寅)과 신(申)은 봄과 가을의 기운이 제대로 나타난 것이다. 제대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봄과 가을의 기운은 시간의 흐름과 맞물려 또 다른 기운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사신해는 그 계절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지점이다. 역마의 시작은 ‘단단하게 서 있음’이고 그래서 어디론가 ‘떠날 수 있는 힘’인 것이다. 움직임 속에 중심이 있고, 가는 방향이 있다는 것이다.
가을의 申은 성숙 단계로 나아가
역마는 돌아갈 곳을 아는 움직임
역마 이치를 따른다면 삶이 안정
떠나야 할 시점이 오면 떠나야
◇인(寅)과 신(申) - 출발과 회귀의 역마
인(寅)은 목(木)의 기운이다. 봄의 시작을 의미한다. 인(寅)은 단단한 껍질을 뚫고 나오는 새싹의 힘이며, 자신을 드러내려는 생명의 욕망이며, 호랑이를 상징한다. 땅의 기운인 지지(地支)는 하늘의 기운인 천간(天干)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숨겨진 이 천간의 기운이 지지를 움직인다고 본다.
인(寅)은 지장간 속에 갑(甲), 무(戊), 병(丙)을 품는다. 갑(甲)은 인(寅)이 가진 본성적 목(木) 운동을 나타내고, 병(丙)은 화(火) 운동으로 씨앗(水운동)을 뚫고 위로 솟아올라(木운동)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펼쳐(火운동)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목(木)의 모습으로 태어나 불(火)을 향해 나아가는 기운이다.
수운동 → 목운동 → 화운동의 세 단계는 위로 자라나는 생명의 힘이다. 따라서 인은 목(木)운동에 머무르지 않고 화(火)운동으로 나아가려는 욕망을 품고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바꾼다. 수많은 병사와 함께 전진하는 장수처럼 담대한 역마다. 어슬렁거리는 삼양삼음(三陽三陰)의 기운을 가진 호랑이가 움직이는 힘은 지장간 안에 있는 화(火)의 기운이다. 입춘(立春) 인(寅) 역마는 ‘새로운 시도의 시작’, ‘스스로 길을 여는 용기’를 상징한다. 말하자면 봄의 역마는 세상으로 나가겠다는 결심의 에너지다.
가을의 신(申)은 그와 반대편에 있다.
신은 금(金)의 기운으로, 화려한 전성기를 뒤로하고 성숙의 단계로 나아간다. 성숙하고 영글어진다는 것은 숙살지기(肅殺之氣)로 정리하고 수렴하는 힘이다. 열매를 맺고,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며, 다음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신(申)은 본연의 金기운과 더불어 지장간 안에 다음 계절인 겨울의 수(水) 기운을 품고 있다. 가을의 열매에 만족하지 않고 그 열매를 다음 해 농사를 위해 단단한 씨앗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나아간다. 신의 역마는 돌아갈 곳을 아는 움직임, 즉 끝맺음을 아는 여정이다. 이것이 입추(立秋) 신(申)의 역마다.
인(寅)이 출발이라면 신(申)은 회귀다.
◇사(巳)와 해(亥) - 절정 속의 냉철함과 고요한 움직임의 역마
입하의 사(巳)는 양기로 가득 찬 불의 절정이다. 가장 뜨겁고 가장 젊은 기운이다.
겉으로는 불꽃같이 치솟지만, 사(巳)의 지장간을 살펴보면, 이글거리는 불 속에 이미 수렴의 씨앗인 경금(庚金)을 품고 있다. 금은 가을의 기운으로 수렴하는 성질이다. 천지를 모르고 날뛰는 듯 보이지만, 사(巳)의 욕망은 결국 가을에 맺을 열매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겉으로는 타오르지만 내면에서는 가을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뜨거운 사(巳)의 냉철한 계획성이다.
입동(立冬)은 해(亥)달(月)이다. 세상 모든 양의 기운이 사라지고, 순음(純陰)의 시간이며 음에너지가 가장 세다. 상강(霜降)에서 마지막 남아 있던 양의 기운이 사라지고, 순음의 기운으로 만물이 동면에 들어간다. 지장간 안의 해(亥)는 본성인 수기운(壬)을 가지며, 동시에 봄의 기운인 목운동(甲)을 품고 있다. 씨앗처럼 단단한 순음(純陰)의 공간에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을 줄기와 세상을 향해 펼칠 푸른 잎을 간직한 해(亥)는 지극한 음의 기운 속에서 강한 양기를 품고 있다. 이것이 입동(立冬) 해(亥) 역마의 계획이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이미 다음 봄을 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亥) 역마는 멈춤 속의 준비, 고요한 움직임이다. 겉으로는 쉬는 듯하지만, 그 속에서는 다음을 향한 생명의 계획이 자라나고 있다.
◇당신의 역마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역마는 자연의 리듬이다
이처럼 인사신해(寅巳申亥)는 자연의 이치다. 겨울의 해(亥)는 봄을 품고, 봄의 인(寅)은 여름으로, 여름의 사(巳)는 가을을 예비하고, 가을의 신(申)은 다시 겨울을 향한다. 모든 움직임은 계획된 순환이며, 방향이 있는 변화인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역마는 어떨까? 우리도 늘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도시를 옮기고, 직장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정리한다. 그때 우리는 종종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언제쯤 안정될까?”를 묻는다. 그러나 역마의 이치를 따른다면, 움직임 자체가 삶의 안정이다. 가만히 있어도 내면의 기운은 계절처럼 돌고 있기 때문이다.
사주의 역마는 단지 ‘떠돌이 별’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리듬을 바꾸는 신호, 멈춰 있던 에너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때로는 환경의 변화로, 때로는 관계의 단절로, 혹은 새로운 배움의 시작으로 나타난다. 역마가 찾아왔다는 것은, 삶이 다시 방향을 찾으려 한다는 뜻이다. 떠나야 할 시점이 오면 떠나야 하고, 멈춰야 할 때는 서 있어야 한다. 중요한 건 ‘움직임’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다.
역마는 당신 안의 시간표다. 움직임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의 본능이며, 방향이 있다는 건 이미 그 안에 당신의 계획이 있다는 뜻이다. 지금 당신의 역마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글=지행 양소용 <한국학박사·영남대 환경보건대학원 환경설계학과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