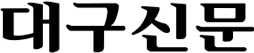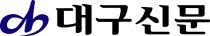형님·동서·아주버님·서방님…
듣기 어려워진 다양한 호칭
말 가벼워지면 관계도 가벼워져
호칭은 관계에 대한 예법인데
요즘은 ‘평등’을 이유로 생략
품격까지 사라질라, 돌아보자

리스토리 결혼정보회사 대표
교육학 박사
요즘 젊은 부부들은 친가, 처가를 구분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로 부른다. ‘시아버님’, ‘시어머님’, ‘장인어른’, ‘장모님’은 사라진지 오래다. 예전엔 ‘아버님’, ‘형님’, ‘며느리’, ‘동서’ 같은 말도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지금은 며느리도 “ㅇㅇㅇ야!” 처럼 이름을 부른다. 신부가 신랑의 형을 부를 때도 ‘아주버님’으로 불렀고 신랑의 동생은 ‘서방님’으로, 미혼이면 ‘도련님’으로 불렀지만 지금은 듣기가 쉽지 않다.
호칭에는 서열만이 아니라 예의와 거리감, 그리고 조심스러운 존중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누구 할 것 없이 그런 말이 불편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한다. ‘편하게 부르자’, ‘평등하게 대하자’는 말이 유행처럼 퍼지면서 호칭도 많이 달라져버렸다. 그 속에 진심 어린 평등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존중이 빠진 가벼움이 자리한다.
호칭은 관계의 최소한 예법이다. 그것이 사라지면 마음의 질서도 함께 흐트러진다. “서로 편하자”는 말이 어느새 “서로 무례해도 괜찮다”로 변하고 만다. 가깝게 지내자고 말하지만 가까움은 예의를 삼킨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부부 사이 호칭도 그렇다. “여보”라는 말이 낯설어지고, “자기야”나 “오빠”, ㅇㅇ야” 심지어 “야!”로 대체된다. 언뜻 다정하게 들리지만 그 말들엔 책임과 존중의 무게가 없다. 부부로서 서로 위하고 도와주며 함께 일상의 삶을 꾸려간다는 관계의 의식 대신 순간의 감정이 중심이 된다. 언어가 가벼워지면 관계도 그만큼 가벼워진다.
물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권위가 무너지고 평등이 일상이 된 지금 옛 호칭을 그대로 강요할 수는 없다. 더욱이 초연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에 있어서는 언어 역시 예전의 모습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 언어는 늘 관계와 세태는 물론 그 시대를 비추게 된다. 그래서 말 속에는 시대의 결이 고스란히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호칭의 변화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호칭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차분히 돌아봐야 한다. 예전의 호칭이 번거롭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예의와 존중,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의 깊이들이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거리감이나 권위, 억압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완충지대였다.
호칭이 달라지고 사라진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얻고 어떤 것을 채우고 있는가.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호칭을 단순화하면서 그 속의 따뜻함과 품격까지 함께 지워버린 건 아닐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단순한 옛 예법이 아니다. 서로를 부를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마음, 예의, 존중들이다. 세상이 바뀌어도 말에는 온도가 있다. 그 온도가 식지 않게 하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호칭을 돌아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