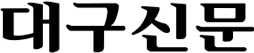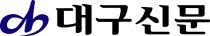이름 삼기 좋은 발음을 찾으려 자신의 본적을 잊은 자들이 끈적한 밤 아래 오밀조밀 모인다 주술과 어둠 없인 요즘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잊어야 하는 날이 죽기 전과 후에 모두 와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도 딱 그만큼만 잘 부탁한다는 일벌들의 우스갯소리처럼, 음색이 과하게 밝은 가요가 너의 머리맡 가장 큰 스피커의 가장 작은 출력으로 흘러가는 것을 듣는다 그건 청각이 아니라 명백한 미각이었음을 말할 시대는 우리에게 없었다 청동새야 청동새야 부르면서, 빛나는 옛 문고리에 쉬운 주문을 외워 넣는 이들과 주석과 은의 최적화된 비율을 찾기 위해 불의 발색(發色)에 땀 흘리던 자들을 구더기라 부르는 호전적 신화의 흥행 속에서, 아무도 흙먼지 속에서 무거운 해머를 쥐려 하진 않으면서, 우리는 잘 짜인 배수 시설의 불멸은 빌면서, 그저 가끔 사물의 안부를 궁금해 했다 모두가 잠들어가도 모두가 피로하기만 한 것을 나는 돌이킬 수 없는 빛이라고 부르고 싶었다
무덤 앞에서, 저녁 앞에서 너의 이름은 뚜껑이라는 의미처럼 잠겨 있다 먹을 수 없는 포도로 평생 즙만 짜던 당신과 먹을 수 있는 포도만 수확하던 당신이 장화로 쐐기를 당연한 듯 뭉개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이유를 짙고 향기롭게 병입(甁入)하면서 서재 속의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는 두꺼운 책처럼 끝도 없이 내어 놓는다 만들지 않는 건 일이 아니라고, 대물려 목을 놓는 소리에 옥과 돌이 모두 같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예비 흙덩이라는 걸 알고도 우리는 주워 담고 깎고 다듬기를 우글우글 계속해야 해, 그럼 우리도 누구에겐 발과 가시가 가득한 밤처럼 징그러울 수 있을까? 대상은 특정할 수 없어도 징그러움 자체는 진실일 거란 생각만 들었다 이제 그만 마시지, 결국 붉은 어지러움도 지겨워지는 날이 오듯이 아무리 아름답게 말해도 이젠 말이 피로한 시대가 되었고 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나는 포도밭에 앉아 푸른 대문을 그리곤, 그게 열리는 꿈을 꾸었다 모두가 붓을 얼어붙은 물감에 찍으려 할 때, 아무도 그림을 그리지 않는 밤이 환하게 와 있었다
◇류성훈= 2012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부문 당선. 시집 ‘보이저1호에게’, ‘라디오미르’, ‘산 위의 미술관’, 산문집 ‘사물들-The Things’, ‘장소들-The Places’가 있음.
<해설> 시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겨울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하고 있다. 그런 그의 화법은 2중 혹은 3중의 암막을 가지고 있다 그냥 읽으면 한 번에 읽히는 문장은 아닌 듯, 살짝 밀치듯 열고 들어가면 자신의 본적을 잊은 자들의 끈적한 밤이 느껴진다. 포도를 따서 밟아서 발효한 뒤 포도주를 만들고 있는 시인은 이제 그만 마시지! 라면서 이젠 말이 피로한 시대가 되었다 한다. 또한 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자책도 한다. 이 시의 백미인 한 부분은 "나는 포도밭에 앉아 푸른 대문을 그리곤, 그게 열리는 꿈을 꾸었다 모두가 붓을 얼어붙은 물감에 찍으려 할 때, 아무도 그림을 그리지 않는 밤이 환하게 와 있었다" 인 것으로 읽힌다. -박윤배(시인)-
무덤 앞에서, 저녁 앞에서 너의 이름은 뚜껑이라는 의미처럼 잠겨 있다 먹을 수 없는 포도로 평생 즙만 짜던 당신과 먹을 수 있는 포도만 수확하던 당신이 장화로 쐐기를 당연한 듯 뭉개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이유를 짙고 향기롭게 병입(甁入)하면서 서재 속의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는 두꺼운 책처럼 끝도 없이 내어 놓는다 만들지 않는 건 일이 아니라고, 대물려 목을 놓는 소리에 옥과 돌이 모두 같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예비 흙덩이라는 걸 알고도 우리는 주워 담고 깎고 다듬기를 우글우글 계속해야 해, 그럼 우리도 누구에겐 발과 가시가 가득한 밤처럼 징그러울 수 있을까? 대상은 특정할 수 없어도 징그러움 자체는 진실일 거란 생각만 들었다 이제 그만 마시지, 결국 붉은 어지러움도 지겨워지는 날이 오듯이 아무리 아름답게 말해도 이젠 말이 피로한 시대가 되었고 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나는 포도밭에 앉아 푸른 대문을 그리곤, 그게 열리는 꿈을 꾸었다 모두가 붓을 얼어붙은 물감에 찍으려 할 때, 아무도 그림을 그리지 않는 밤이 환하게 와 있었다
◇류성훈= 2012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부문 당선. 시집 ‘보이저1호에게’, ‘라디오미르’, ‘산 위의 미술관’, 산문집 ‘사물들-The Things’, ‘장소들-The Places’가 있음.
<해설> 시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겨울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하고 있다. 그런 그의 화법은 2중 혹은 3중의 암막을 가지고 있다 그냥 읽으면 한 번에 읽히는 문장은 아닌 듯, 살짝 밀치듯 열고 들어가면 자신의 본적을 잊은 자들의 끈적한 밤이 느껴진다. 포도를 따서 밟아서 발효한 뒤 포도주를 만들고 있는 시인은 이제 그만 마시지! 라면서 이젠 말이 피로한 시대가 되었다 한다. 또한 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자책도 한다. 이 시의 백미인 한 부분은 "나는 포도밭에 앉아 푸른 대문을 그리곤, 그게 열리는 꿈을 꾸었다 모두가 붓을 얼어붙은 물감에 찍으려 할 때, 아무도 그림을 그리지 않는 밤이 환하게 와 있었다" 인 것으로 읽힌다. -박윤배(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