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중국 소흥서 산 도자기
새 머리 모양 주구와 둥근 손잡이
여러가지 그림 그려져있는 몸체
용도를 알 수 없어 더 재미느껴

멋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향유하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다. 흥미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은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인간, 자연, 예술작품 등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수시로 느낄 수 있다면 그 삶은 더욱더 충만하지 않겠는가. 골동품의 멋과 아름다움에 빠지는 이들도 적지 않다.
골동(骨董)은 오래된 물품으로 희소성과 미술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서화나 도자기는 물론, 생활 도구나 농업용품 등 각종 기물이 모두 해당한다. 고완(古玩), 고미술품 등으로도 불린다.
옛사람들의 삶과 운치가 깃든 물품으로, 옛 것에 대한 취미를 길러주고 풍류와 정취가 있는 생활을 누리게 하는 매체가 되어왔던 골동. 단순한 수집보다는 그 진수를 향유할 수 있는 안목과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감식력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 여행을 갔을 때도 골동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는 골동품을 파는 거리를 둘러보는 재미도 큰 즐거움 중 하나다. 필자도 골동에 조금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으니 마음에 드는 골동이 있어도 선뜻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기만 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고, 간혹 비싸지 않고 내가 흔쾌히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물건을 골라 살 때는 있다. 그 중 하나는 30여 년 전 중국 소흥 소주에 갔을 때 산 도자기 하나가 있다. 10만 원 미만의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용도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골동이었다. 새 머리 모양의 주구가 있고, 그 반대편은 새 꼬리 모양 같은 둥근형태의 손잡이가 있다. 작은 도자기인데. 둥그런 몸체에는 청화로 소나무와 대나무, 풀, 집 등과 함께 옛날 복장의 사람 다섯 명이 그려져 있다. 가끔 한 번씩 들고 살펴보는데, 그림이나 용도 등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더 재미를 느낀다.
◇어느 화랑에서 본 무쇠솥
얼마 전에는 대구 봉산문화거리 한 화랑에서 무쇠 화로로 보이는 골동품을 보았다. 손잡이가 두 개 달려 있고, 위 바깥 둘레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고, 몸통에는 글씨도 새겨져 있었다. 고급품으로 만든 듯했다. 경매를 통해 구입했는데, 언제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것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안쪽에는 녹이 두껍게 쓸어 있어 부숴낸 흔적이 있었다. 찻물 끓이고 데우는 전기 화로를 만들어 사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몸통 바깥 면에는 빙 둘러가며 글귀가 돋을새김으로 새겨져 있는데, 한문 글귀 ‘도리불언하자성도(桃李不言下自成途)’였다. 나중에 무슨 글귀인지 찾아보았다. 내가 본 골동 솥에는 ‘도(途)’자이나, 비슷한 의미의 지름길 ‘혜(蹊)’자 대신 이 ‘도’자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고사에서 유래된 원래 글귀는 ‘도리불언하자성혜(桃李不言下自成蹊)이다. 그 의미는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밑에 저절로 길이 생긴다’라는 뜻이다.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는 그 꽃이 곱고 열매가 맛이 좋으므로, 오라고 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그 나무 밑에는 길이 저절로 생긴다는 것이다. 덕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따름을 비유해 이르는 말이다.
이 글귀는 중국의 사마천이 지은 역사서 ‘사기’ 중 ‘이장군열전(李將軍列傳)’에 나온다. 중국 한나라 무제 때 장군 이광은 활의 명수로 유명했다. 힘이 세고 몸이 빨랐기에 흉노족들은 그를 한나라의 날아다니는 장수라는 이름으로 ‘한비장군(漢飛將軍)’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면 임금이 내려준 상도 부하들에게 나눠 주었다. 병사들은 점점 더 이광에게 충성을 다했다. 그러나 패배를 모르던 이광의 영광에도 그림자가 드리웠다.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아군도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
무제의 외척인 위청(衛靑)이 대장군으로 임명돼 수십만의 대군으로 흉노와 결전을 벌이게 됐다. 이 싸움에서 이광의 군대는 그만 길을 잘못 들어 싸움터에 늦게 도착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어째서 늦게 왔는지 사유를 보고하라.” 대장군이 이광의 실수를 문책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 그러자 이광의 부하들은 “대장군이 무리하게 진군을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밝히십시오”라고 진언했다.
그러나 명예로움을 중하게 여기는 그는 문책 받는다는 것 자체가 치욕이었다. 이광은 칼을 뽑아 자기 목을 베었다. 이광의 병사들은 모두 목 놓아 울었다. 사마천은 이 일을 적은 뒤에 이광을 기리며 이렇게 적고 있다. “‘복숭아와 자두나무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밑에 저절로 길이 생긴다’라는 말은 바로 이 장군을 두고 한 말이다.”
진품을 사는데 큰 돈이 들지만
부자 아니라도 즐길 수 있어
분야를 최대한 협소하게 만들어
자신의 분수에 맞도록 즐겨야
◇히데요시와 리큐
일본 메이지 시대의 대표 작가인 고다 로한(幸田露伴·1867~1947)이 쓴 글에 나오는 내용이다.
‘식욕과 색욕만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아직 개나 고양이 수준으로 그곳에 만족하지만, 혹 그렇지 않고 이를 초월하는 인간은 반드시 골동품을 좋아하게 된다. 말하자면 골동품을 좋아하게 됨으로써 인간 수준으로 오르게 되기 때문에 돼지나 소 등의 짐승은 골동품을 만지작거리거나 하는 예시를 보이지 않는다. 골동품을 만지작거리려 하는 건 성장해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골동품은 증거물품이다. 그래서 학자도 학문의 종류에 따라 학식이 깊어지면 반드시 골동품 세계에 고개를 들이밀고 손을 뻗게 된다.’
이런 글귀도 있다.
‘위조품을 사는 건 수업료를 내는 것이므로 조금도 부당한 일이 아니다. 또 수업료를 엄청 낸 끝에 마침내 진품, 진짜 그림을 큰돈을 주고 산다. 즐거울 게 분명하고 자랑을 해도 될 게 분명하다. 즐거워하라, 자랑하라. 그 큰돈은 희열세이고 교만세이다.’
이 교만세 납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던 건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라고 했다. 다이묘에서부터 유복한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골동 다기로 앞 다투어 교만세를 지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히데요시의 위광을 등에 지고 아찔할 정도로 눈부시게 빛났던 자가 다도인 센노 리큐라고 했다. 이 리큐를 히데요시가 부렸던 것.
취미의 세계에서 최고의 위치에 설 만한 불세출의 인물인 리큐가 아름다워 한 물건은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워 하고, 리큐가 재밌어 하고 귀하게 여긴 물건은 세상 사람들이 재밌어 하고 귀하게 여겼다. 리큐가 지목한 물건은 그게 외따로 떨어진 도자기 한 점일지라도 한 번 그 지목을 거치면 곧장 금옥이 헛되지 않은 물건이 되었다. 사람들은 앞 다투어 리큐가 귀하게 여긴 물건을 귀하게 여겼다. 그걸 얻어 희열하고 그걸 얻어 교만을 부리기 위해 교만세 납부를 굳이 감행했다. 그 교만세 액수는 전부 리큐가 간접적으로 조사하고 감정했다. 히데요시는 이런 센노 리큐를 총애하며 부렸다.
필자는 골동에 미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마력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골동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다른 모양이다. 골동에 빠져 지낸 적인 있는 한 지인은 귀신에 씐 것 같다는 표현을 썼다. 한번 꼽히면 누워도 앉아도 그 생각밖에 없고, 거듭되는 마누라 등살도 개의치 않게 되더라고 했다.
고다 로한은 부자가 아닌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골동을 즐기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다. 관계를 맺으려는 골동의 분야를 가능한 한 협소하게 만들어 자신의 분수 안에서 세월을 즐기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림이라면 어느 파의 누구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도자기라면 어디 가마 어느 시대의 것이라든가, 글씨라면 유학자 중 누구의 작품에 한정하는 식이다. 이런 ‘특정 분야 외길 수집·연구’가 현명하고 정상적인 방식이고, 상응하게 수업료만 지불하면 안목도 높아지고 멋도 알게 되어 무난히 정오를 분별하며 별 문제 없이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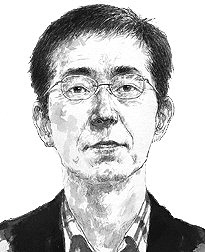
글·사진=김봉규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