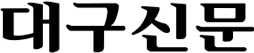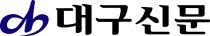고봉수가 돌아왔다. 신작 영화 ‘귤레귤레’다. 귤레귤레는 튀르키예 말로 ‘안녕히 가세요, 잘 가.’라는 인사다. 전작 ‘습도 다소 높음’으로 호흡을 맞춘 이희준과 고봉수 사단의 신민재가 합류했다. 눈에 띄는 변화도 보인다. 무엇보다 사이즈가 커졌다.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제작지원 작품이다. 튀르키예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하면서 카파도키아에서 하늘로 오르는 벌룬도 찍었다. 스태프 6명에 7회 차로 해외촬영을 마무리한 건 고봉수라서 가능했을 거다.
‘귤레귤레’는 카파도키아에 출장 왔다가 여행에 나선 남자 대식과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 여행을 온 여자 정화가 우연히 만나 벌이는 로맨스 드라마다. 감독은 한때 연인이 될 수도 있었던 남녀의 이야기를 씨줄로 잡고, 여행지에서 벌어지는 불만과 다툼의 좌충우돌을 날줄로 풀어간다. 이전까지 고봉수의 영화가 분투하다 주저앉으면서도 세상을 비관하지 않는 인물들로 페이소스를 불러일으켰다면 신작은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한다. 즉 여전히 미완성인채로지만, 삶의 실마리를 찾은 옅은 미소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사이즈가 커졌다는 건 제작비와 규모만의 얘기가 아니었다. 시선의 상향조정이라고 말해도 좋으리라. 주인공 역을 맡은 이희준은 이전까지 고봉수 영화의 주연 배우들보다 키가 크다(물론 농담이면서 사실이다.).
여행지에서 벌어진 아수라장이 가져온 뜻밖의 변화. 지리멸렬한 여행기가 판타지로 선회하면서 종반을 향할 때, 어쩌면 새로운 사랑과 다른 삶을 찾을 기회가 생길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은 두 사람은, 밤을 새워 변명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위로받는다. 여기까지가 영화적 장치라면 정말로 영화 같은 엔딩은 외려 현실적이다.
삶이 원래 그런 거 아니던가. 운명처럼 다가온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물거품이 돼버린 경험 말이다. 그러니까 티격태격 티키타카를 오가는 대석과 정화의 관계가 급진전할 것처럼 그려지는 건 영화라서 가능할 따름이고, 현실로 돌아오면 평면이 아닌 입체적 상황이 가로막는다는 것. 안타까운 표정과 회한 섞인 눈물로 가득할지라도 현실에선 어림도 없다는 얘기다. 사랑은 언제나 한발 늦게 도착한다는 얘기는 영화에도 해당된다. 때문에 혹자가 기대하는 뻔한 클리셰로 엔딩을 그렸더라면 고봉수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딱 아쉬운 만큼의 투덜댈 구실을 남겨주면서 가슴 벅찬 여운을 안긴 엔딩 쇼트라니.
카파도키아의 새벽, 차에서 내려 하늘을 응시하는 정화의 발아래에서 거대한 벌룬이 떠오를 때, 벌룬에 탄 대식이 세상을 항해 “귤레귤레”라고 외칠 때, 상처받은 과거도 불행한 결혼도 잠시 품었던 설렘도 미안함과도 모두 이별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대석의 다짐은 고봉수 영화의 미래가 된다. 그리고 자막이 올라갈 때 흐르는 노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고봉수는 “가시 같은 말을 내뱉고 날씨 같은 인생을 탓하고, 또 사랑 같은 말을 다시 내뱉는 것. 사랑 같은 말을 내뱉고 작은 일에 웃음 지어놓고선 또 상처 같은 말을 입에 담는 것”이라는 허회경의 노래를 들으면서 시나리오를 썼을 것이다. 상처 가득했던 과거도, 진저리치던 결혼생활도, 튀르키예에서의 혼란스런 감정도, 이제는 웃으며 안녕, 귤레귤레.
백정우·영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