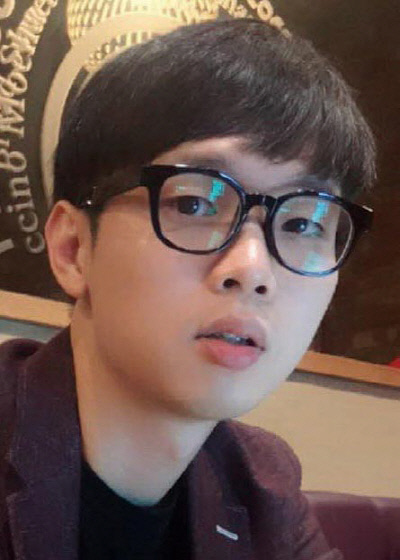
환율 상승이 반드시 부정적인 신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원화 약세가 가격 경쟁력 강화를 가져와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수출 중심 산업은 고환율의 직간접적 수혜를 받는다. 그러나 이익의 수혜 범위는 제한적이며, 국가 전체로 보면 고환율의 그늘은 더욱 넓게 드리워진다. 수입 물가 상승은 필연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된다. 기업의 생산비는 오르고, 가계 부담도 늘어난다.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을 자극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결국 문제는 ‘지속성’이다. 단기적 고환율은 방어가 가능하지만 장기화할 경우 한국 경제는 구조적 비용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환율 개입이나 정책적 미봉책이 아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근본적 해법이 요구된다. 첫째, 수출 기반을 다각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 물가·금융·재정정책이 분절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거시정책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고환율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거울이다. 지금 이 거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문제를 직시하고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고환율은 위기이자 기회다. 선택은 결국 우리 경제의 앞으로 10년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