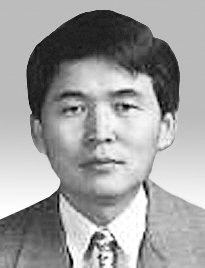표준어로 ‘닭벼슬’ ‘닭 볏’
경상도 사투리로 ‘닭비슬’
닭벼슬 닮아 ‘비슬산’이라 해
지구촌에 ‘닭벼슬산’이 많아
경기도·경남·강원도에도 있어

과거는 ‘동트는 달구벌(黎明達句伐)’이라면 앞으로는 ‘동트는 달성군(黎明達城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지명으로 아직도 두 군데에 남아있다. AD 909년에 최치원이 쓴 ‘신라수창군호국성팔각등루기(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에 달구벌에서는 북두칠성의 자미원(紫微垣)에 하늘 닭이 보인다고 ‘천왕지(天王池, 혹은 天皇堂池)’라고 기록했다. 천왕지(天王池)에다가 조선총독부에 의한 일본인 노모리 켄(野守健)과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가 7기의 달성 고분 발굴작업의 잔토처리장이 되어 1922년 9월 28일자로 서문시장(西門市場)이 이전되었다.
한편, 표준어로 ‘닭벼슬(cockscomb)’ 혹은 ‘닭 볏(鷄冠, cockscrown)’을 경상도 사투리에서는 오늘날도 ‘닭비슬’이라고 한다. 닭벼슬을 닮았다는 이산을 ‘비슬산(鷄冠山·1,084m)’이라고 했다. ‘벼슬(高官大爵)’이라는 동음으로 고려 958(광종 9)년 후주(後周) 쌍기(雙冀)의 건의로 과거제도를 실시한 이후 벼슬살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찰에 몰려들었다. 성주인(星州人)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 1347~1392)도 비슬산기슭 산사(山寺) 의 승사(僧舍)에서 과거를 준비했으며, 그는 공민왕(恭愍王, 재위 기간 1352~1374) 때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숙웅부승(肅雍府丞), 성균사성(成均司成),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 밀직제학(密直提學) 등을 역임했으며, 시문집 ‘도은집(陶隱集)’을 남겼다.
도은집(陶隱集)에서 ‘승사를 제목으로(題僧舍)’를 소개하면, “메 남쪽 메 북쪽 오솔길은 갈려졌는데, 솔꽃들이 비에 젖어 이리저리도 떨어졌네. 수도하던 사람들은 물길어 초가집으로 돌아가더니. 한 줄기 푸른연기가 흰 구름을 물들이고 있네.”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그대는못 봤는가? 옛날이나 오늘에도 너무도 가볍게 뒤집는 많은 사람들! 아침에 동지가 저녁엔 원수(敵)가 되네(君不見古今多少輕薄兒, 朝爲同胞暮仇敵).”라는 ‘오호도(鳴呼島)’의 끝 구절이 마음 한구석에 남는다.
오늘날도 진달래꽃이 만발하는 비슬산은 한마디로 왜 ‘닭벼슬(鷄冠)’을 상징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구촌에는 ‘닭벼슬산(Cockscomb Mountain)’이 많다. 당장 기억이 나는 것으로 i) 남아프리카(South Africa) 이스턴 케이프(Estern Cape)에도 있고, ii) 캐나다(Canada) 앨버터주에서 소백산맥(Sawback Range)에 퇴적암 ‘닭벼슬 산(鷄冠山)’이 있으며, iii) 남미(南美) 온두라스(Honduras) 밸리즈 중부에 ‘닭벼슬 산맥(Cockscomb Range)’이 16km나 뻗어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닭벼슬산(鷄冠山)이 많다. 등반했던 추억이 있던 i)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ii) 경남 함양군에도 iii) 강원도 춘천에도 해발 710m의 닭벼슬 산(鷄冠山)이 있다.
그런데 달성군의 ‘닭비슬산(Cockscomb Mountain)’은 당나라에서 불교도량이 있는 산을 법산(法山)이라고 했음을 본받아 신라에선 음역으로‘포산(苞山)’ 또는 ‘포산(包山)’이라고 했다가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시대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일연(一然, 속명 全見明, 1206~1289) 스님이 1281년에 쓴‘삼국유사(三國遺事)’에선 “포산 이성(包山二聖) 설화”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곧바로 해동도량(海東道場) 포산(包山)임을 암시하고 있다.
산 모양이 ‘앉아 있는 부처(坐佛)’ 혹은 “누워 있는 부처(臥佛)”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부처 모양 뫼(佛山)’라고 했다. 중국 광동성(廣東省) 포산시(佛山市) 송대의 도교 조묘(祖廟)가 있고, 옥황상제가 500년 동안 손오공을 오행산(五行山, 일명 太行山) 태항산(太行山)은 산 모양이 와불(臥佛)을 하고 있다. 베트남 다낭시 남부지역에 오행산(五行山)이 있다. 산 모양은 와불(臥佛)이다, 그런데 비슬산 기슭엔 와불(臥佛) 모양이 대부분이나, 유가읍(瑜伽邑) 용리(龍里) 일연선사길 40번지(GPS 북위 35도41분31.0초, 동경 129도30분48.1초)에서 북향으로 비슬산(苞山) 정상을 보면 일명 사람 얼굴 모양 혹은 좌불(坐佛) 모양이 드러나고 있다.
달성군에는 포산 곽씨(包山郭氏 일명 玄風郭氏), 포산중·고등학교 등이 아직도 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고, 임진왜란을 즈음하여 포산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았던 백성들을 이상규(李相揆) 작가는 2015년 “포산 들꽃”이라는 장편소설을 통해서 시대의 모습을 그렸다.
억불숭유(抑佛崇儒)의 이념으로 건국한 조선 선비들은 중국 전통악기 ‘비슬(琵瑟)’이라는 의미적 사대주의로 윤색(潤色)했다. 최근에는 인도(印度, India)의 스님이 이곳에 왔던 불교도량(佛敎道場)이라고 우주창조의 ‘비슈누(毘紐)’를 ‘비슬(琵瑟)’로 음역했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으로 조선 시인소객(詩人騷客)들은 소슬바람, 솟을대문 등과도 산 이름을 연결하여 ‘소슬산(所瑟山)’이라고도 했다.
◇고대 천문학에서 ‘하늘 닭(天鷄)’과 달구벌(達城郡)?
동양 고대 천문학(도교)에서는 북두칠성의 자미원(紫微垣)에서 천제(天帝, 玉皇上帝)가 사는데 그곳에서 하늘 닭(天鷄, Heaven Cocks)이 있어 삼시여명(三時黎晨)을 알린다. 천상에서 천계(天鷄)가 울면 이를 받아서 지상에 “새벽을 알리는 닭(司晨鷄)”들이 따라 새벽을 알려 동트게 한다. 고대 천문학에서 28개 별자리(二十八宿) 가운데 i) 동남쪽(巽方)에 알곡식을 까부는 키(箕)에 해당하는 별자리 기성(箕星)이란 키앞에서 날려 떨어지는 알곡을 먹는 하늘 닭(天鷄)이 있다고 생각했다. ii) 남서쪽 두성(斗星, 세칭 南斗六星)에도 하늘 닭(天鷄, Heaven Cock))이 있다고 믿어왔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는 기성(箕星)의 천계를 보고 흉년과 풍년을 점쳤다. 기성을 검색어로 찾아보니 35회의 기성(箕星)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고대 천문학의 28개 별자리(二十八宿)를 중국 고대왕조에서는 천황(天皇), 천자(天子) 혹은 천제(天帝) 등의 호칭에 걸맞게 천기를 읽고 천문도(天文圖)를 작성했다. 왕조별로 천문도를 작성했으며, 대천문도(大天文圖), 혼천문도(渾天文圖), 천상열차천문도(天象列次天文圖) 등으로 호칭했다. 고려시대부터 왕조별과 천문을 응용하여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天文分野之圖)를 작성하여 조선시대까지 이용했다. 뿐만 아니라 천문학의 28개 별자리에서 중국의 대륙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기성(箕星)으로 봤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서는 제갈공명(諸葛孔明)은 도수별(度數別)로 중국의 주군(州郡)을 ‘천하분야도(天下分野圖)’로 작성했다.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1545~1598))도 주군(州郡)의 분야도를 28개 별자리에 배치한 ‘지상혼중도(地象昏中圖)’를 군사작전에 이용했다. 특히 대구(달구벌)지역을 천문도에 배치한 1850(철종1)년에 대구지역 출신 이기정(李基晶, 생몰연도 미상)이 작성한 ‘태을산분정아국주군분야(太乙算分定我國州郡分野圖)’가 있는데, 2013년 10월 30일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제66호로 지정했다.
태을산분정아국주군분야도는 이기정(李基晶)이 1850년(철종 1)에 작성한 천문도이다. 내용은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8수의 성수별(星宿別)로 별자리의 성상도(星象圖)가 그려져 있고 그 그림에 도수(度數)가 각각 부기된 부분, 중국 제갈량의 천하 분야도(天下 分野圖)가 도수별(度數別)로 표기된 부분,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이 제시한 우리나라 주군(州郡)의 분야도가 각 수(宿)에 따라 표시된 부분, 혼중도(昏中圖)를 24절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10월 30일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66호로 지정되었다. 그 후 2021년 6월 2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었다.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2가 42에 있는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923년 이장훈(李章薰, 생몰연도 미상)이 편찬한 ‘홍연진결(洪烟眞訣)’ 열읍추수장(列邑推數章)에서는 달구벌(오늘날 대구와 달성군을 포함) 지역을 우리나라에서 두성(斗星, 南斗六星)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기록하고 있다.
기성의 천계 보며 흉·풍년 점쳐
조선왕조실록에 35차례 나와
中, 한반도를 ‘별나라’ 표현도
망국유민들, 한반도로 들어와
중국에서는 한반도를 기성(箕星)으로 봐서 ‘별나라(辰國)’ 혹은 ‘별 동네(辰韓)’이라는 표현을 문헌에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대륙에서 망국유민(亡國流民)들이 연연세세 풍년(年年歲歲 豊年)이 든다는 ‘기성의 한반도(箕子朝鮮)’으로 들어왔다. 진시황제(秦始皇帝)의 만리장성 등의 강제노역을 피해 BC 230년부터 BC 220년까지 한반도에 들어와서 삼한 때는 밀양(密陽, 彌離彌凍國) 수산제(守山堤), 단밀(丹密, 難彌離彌凍國)의 대제지(大堤池) 등을 축조해 수도작농경(水稻作農耕)을 개막했다. 그들은 하나 같이 한반도에서는 기성(箕星) 혹은 두성(斗星)으로 천계(天鷄, Heaven Cock)가 있어 연풍(連豊)을 점지해준다고 믿었다. 특히 달구벌(達句伐)에는 기성(箕星)과 두성(斗星)의 2마리의 천계(天鷄, Heaven Cocks)가 있는 지역으로 믿어왔다. 그래서 신라 때부터 북두칠성자미원(北斗七星紫微垣)이 비치는 천왕지(天王池)가 있었다. 오늘날까지 닭벼슬(鷄冠)을 상징하는 비슬산(毗瑟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연으로 ‘동트는 달구벌(The Dawn of Dalgubeol)’ 혹은 “미래 여명이 밝아오는 달성군(The Dawn of Future Dalseong-gun)”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